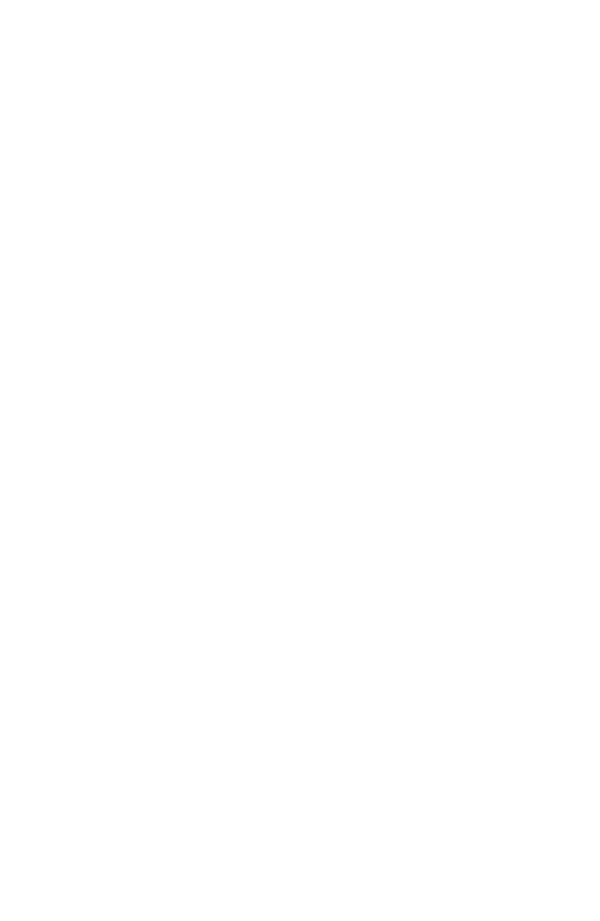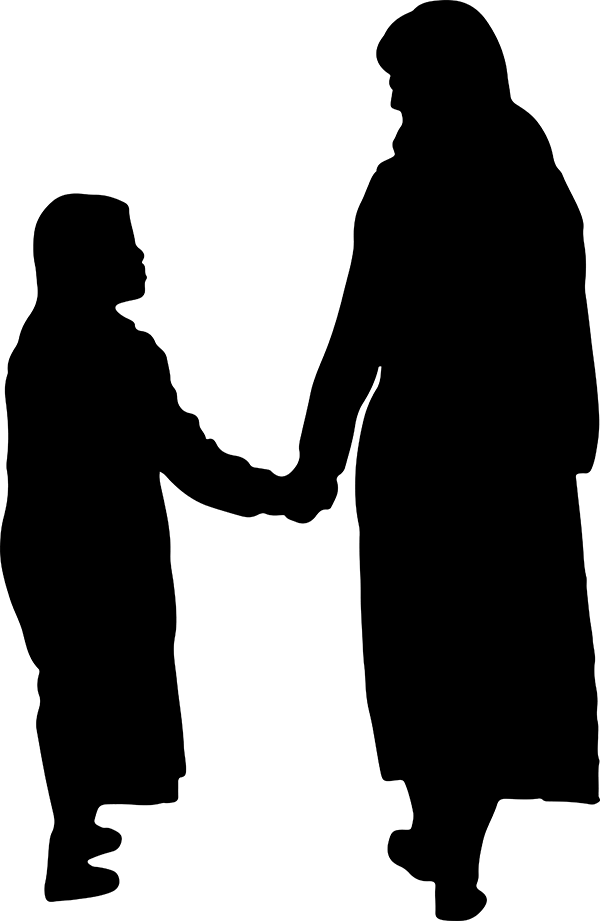독립 영화,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 시가 되다-오마이뉴스
박순리 감독의 영화 (2022) 상영회가 열리다
지방살이를 하다 보면, 보고 싶은 영화를 쉽게 볼 수 없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독립영화관에서만 상영한다는 소식에 짧게 탄식하고 OTT에 등장하기를 기다린다. 방구석 화면으로 생활 소음과 함께 만나는 것은 이미 감독이 의도한 영화가 아니어서 영화를 영화답게 볼 수가 없다. 가끔은 영화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서 보고 싶다는 열망조차 가질 수 없다.
영화 <섬.망(望)>(prayer of the isle, 2022)은 그렇게 힘들게 만난 영화다.
2022년 제 23회 전주국제영화제 초대작인 박순리 감독의 영화 <섬.망(望)>은 영화제에서 소개된 주요 작품을 모아 가을에 상영하는 ‘폴링 인 전주’ 이후, 어느 곳에서도 볼 기회가 없었다. “그저 그런 여배우와 단신 대머리남의 연애”(2014) 이후 네 번째 작품을 선보인 박순리 감독은 충남 홍성에서 살다가 이웃에서 키우던 염소를 살리기 위해 마당 있는 곳을 찾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여로 삶터를 옮겨왔다.
이미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던 박순리 감독과 김정민우 촬영감독의 순리필름 영화들이 독창적인 세계를 품을 수밖에 없는 우직함을 엿볼 수 있는 사연이다.
꾸준히 독립영화를 제작, 응원하고 있는 인디라인의 김대현 감독은 영화 <섬.망(望)>이 제대로 관객을 만나는 기회도 없이 지나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직접 상영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군산시 옥산힐빙센터(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45)에서였다.
옥산힐빙센터에서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옥산동네시네마’가 진행되었다. 군산문화도시센터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대현 감독은 대중적 장르영화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영화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었던 동서고금의 영화를 선보였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감독이나 영화평론가를 초대하는 GV도 진행했다.
김대현 감독은 군산 시내에 위치한 인문학창고 정담(군산시 해망로 244-7)에서 매주 영화 전문가와 감독의 강연으로 구성한 ‘정담시네마’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군산 시민의 눈높이를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빛의 방향과 질감과 양, 시간의 방향과 흐름, 그리고 속도를 잡아낼 수 있는 영상만의 특징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특한 사운드의 역할이 중요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극장 공간에서의 관람이 필수적이다.
가수 나미의 데뷔 시절 무대 영상이 큰 극장 스크린에 소리 없이 펼쳐지는 초반 신의 경우, 극장 아닌 곳에서 본다면 그 맥락과 의미가 전혀 달라질 것이다. 관객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극장 신을 극장에서 관람하는 것은 다른 장면들과 함께 일종의 특별하고 유일한 체험이 될 것이다.
제목처럼 영화 <섬.망(望)>은 섬처럼 고립된 인물의 삶이 먼지처럼 회상처럼 부유하고, 섬망에 빠진 인물이 꾸는 꿈은 누구의 꿈도 될 수 있게 되며 누군가의 꿈 속에서 꿈의 꿈을 꾸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극장에 앉은 우리는 화면의 세계와 극장의 세계, 그리고 현실의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짐을 느낀다.
꿈은 나도 모르게 나의 현실이 되고, 인물의 분열과 중첩으로 곧 인물과 나의 위치가 뒤바뀌기도 한다. 나만의 고유한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독한 고집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 빠르게 지나치거나 그대로 굳어 버린다.
감독은 그 모든 시간의 고유함을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고 끈질기게 말을, 아니 컷을 이어간다. 마침내 끝날 듯 끝나지 않던 끝에 이르면, 간절하고 희미한 아름다움이 그리워서 관객이자 인물인 내가 끝내기를 거부하려 한다. 그리하여 극장 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빛은 온전한 내 삶의 몫이 된다.
글 김규영 / 오마이뉴스